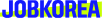매일의 일을 통해 전진의 힘을 얻게 하라!
HR매거진 2023.06.08 17:22 556 0
지난 팬데믹 3년을 대사직(Great Resignation)의 시대라고들 한다. 실제로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직이 늘어났을까?

▶ 늘어난 이직, 그 이유는?
이직 현상을 잘 설명하는 직무 배태성(Job embeddedness)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조직에 머물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은 동료들과의 연결Link, 업무 및 조직의 적합성Fit, 이직으로 발생하는 희생(Sacrifice)의 크기다. 팬데믹은 세 요인 모두에서 이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비대면 원격근무로 연결을 상실했고, 이직 후 기대연봉의 상승으로 희생은 최소화됐다. 또, 코로나라는 강력한 외부 충격은 일과 직장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삶과 건강이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은 식었고, 대신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로 자산 증식의 기회는 넘쳐나는 듯이 보였다. 그러면서 단기간의 고위험 투자로 큰 자산을 만들고 조기 은퇴해 가족과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직장인들의 로망이 됐다. 자신과 잘 맞는 직장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만족과 성취감은 부차적인 것이 된 것이다.
▶ 대사직 러쉬에 대한 기업의 전략
이러한 대사직 러쉬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대표적인 인재유지(Retention) 전략은 연봉인상과 근무형태 유연화였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이직자 대부분이 연봉상승과 더 좋은 근무조건의 혜택을 누렸고 잔류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했다. 최근 대두되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현상의 심리적 근원이다. 그러나 이제 노동시장은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에서 시작된 대규모 감원은 서비스, 유통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높은 보상으로 인재를 유인하거나 유지하려는 전략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원격근무(Work-from-anywhere)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는 어떠한가? 국내외 기업들은 전면 사무실 근무로 전환하거나 비대면 근무와 절충한 하이브리드 근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근무시간 단축, 비대면 근무, 워케이션 등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근무형태 결정권을 누렸던 구성원들은 사무실 출근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형태와 방식 역시 경영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는 없다. 한때 유연근무를 적극 옹호했던 빅테크 기업의 경영자들까지도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일은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던 메타(Meta)의 마크 저커버그는 대면근무를 하는 직원이 더 성과가 좋다고 강조한 바 있고, 여러 기업에서는 비대면 근무와 주 4일 근무의 생산성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현실은 냉정하다. 구글의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이끌었던 라즐로 복(Lazlo Bock)은 하이브리드 근무는 몇 년간 과도기를 거쳐 결국 종전의 주 5일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팬데믹 동안 원격근무나 유연근무가 MZ세대의 새로운 가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적 근무방식으로 정착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유연근무 때문에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근무시간 단축이 보상의 축소로 연결된다면 MZ세대라고 해서 막연히 그것을 지지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지난해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사업장의 비율이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때 20세기의 유물로 치부되던 주 5일제와 사무실 근무가 돌아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이다.
▶ 인재가 머무는 직장 만들기
그렇다면 인재가 머무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 핵심은 근무형태나 유연근무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일정과 업무방식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팬데믹 동안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향상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출퇴근시간 절약이나 협업 툴의 확대와 같은 표면적인 요인이 아닌, 구성원의 자율성과 업무 통제권 증가,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주도성의 증대에 있었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상사나 동료들과 주요 이슈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업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변화에 압도되어 업무 과정을 과도한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원격근무가 확대되면서 대기업들은 직원 위치 파악, 안면인식, 메타버스 기반의 근태관리 등 감시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물론 팬데믹 동안 크게 확대된 각종 화상회의 플랫폼, 모바일 기반의 협업 툴, 데이터 기반의 HR 의사결정과 AI가 지원하는 인사 및 조직관리 기법들은 분명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와튼 대학의 피터 카펠리(Peter Cappelli) 교수는 이러한 최적화(Optimization) 모델이 지나칠 경우 구성원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관해 고민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된다면 머지않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인재유지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자율성과 업무 통제권 그리고 주도성 확대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의 테레사 애머빌(Teresa Amabile) 교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업무성과 인정이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매일의 업무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전진(Small wins)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사명감이나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매일 하는 업무에서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직원들은 가장 크게 동기부여가 됐고, 업무성과도 가장 좋았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구성원의 전진 지수(Progress index)를 측정하고, 구성원의 전진을 어떻게 지원했는가를 관리자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아야 한다. 매일의 일을 통해서 '전진의 힘'을 얻는 직원들이 사소한 연봉차이, 복지, 근무제도 등을 이유로 직장을 쉽게 옮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정명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본 기사는 월간 HR Insight 2023. 5월호의 내용입니다.
HR Insight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png)